
운전을 하다 보면 무심코 비상등을 켜는 경우가 많다. 차선을 양보받은 뒤 “감사합니다”의 표시로 켜는 경우도 있고, 편의점 앞에 차를 잠시 세우며 비상등을 켜두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사용’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비상등은 정식 명칭으로 ‘비상점멸등’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장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비상등은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정차하거나 저속 주행 중일 때,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단순한 정차나 운전자의 의사 표현으로 비상등을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비상등은 인사 수단이 아니라 주행 중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안전 장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등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터널이나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해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할 때,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

이외의 상황, 예를 들어 택시나 배달 차량이 잠깐 이중 주차를 하며 비상등을 켜두는 행위, 운전 중 누군가가 차를 양보해줬을 때 감사 표시로 깜빡이는 행위, 편의점이나 상점 앞에 차를 세우며 비상등을 켜놓는 경우 등은 모두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사용이다.
비상등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다. 실제로 서울의 한 도심 도로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이 비상등을 켜둔 채로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많은 운전자들은 “딱 1~2분이면 되니까”, “비상등 켰으니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비상등을 남용한다. 그러나 비상등은 엄연히 안전을 위한 장치이며,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운전자가 비상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비상등은 나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신호’이자 ‘약속’이다. 인사나 편의를 위한 깜빡임이 아닌, 위험을 알리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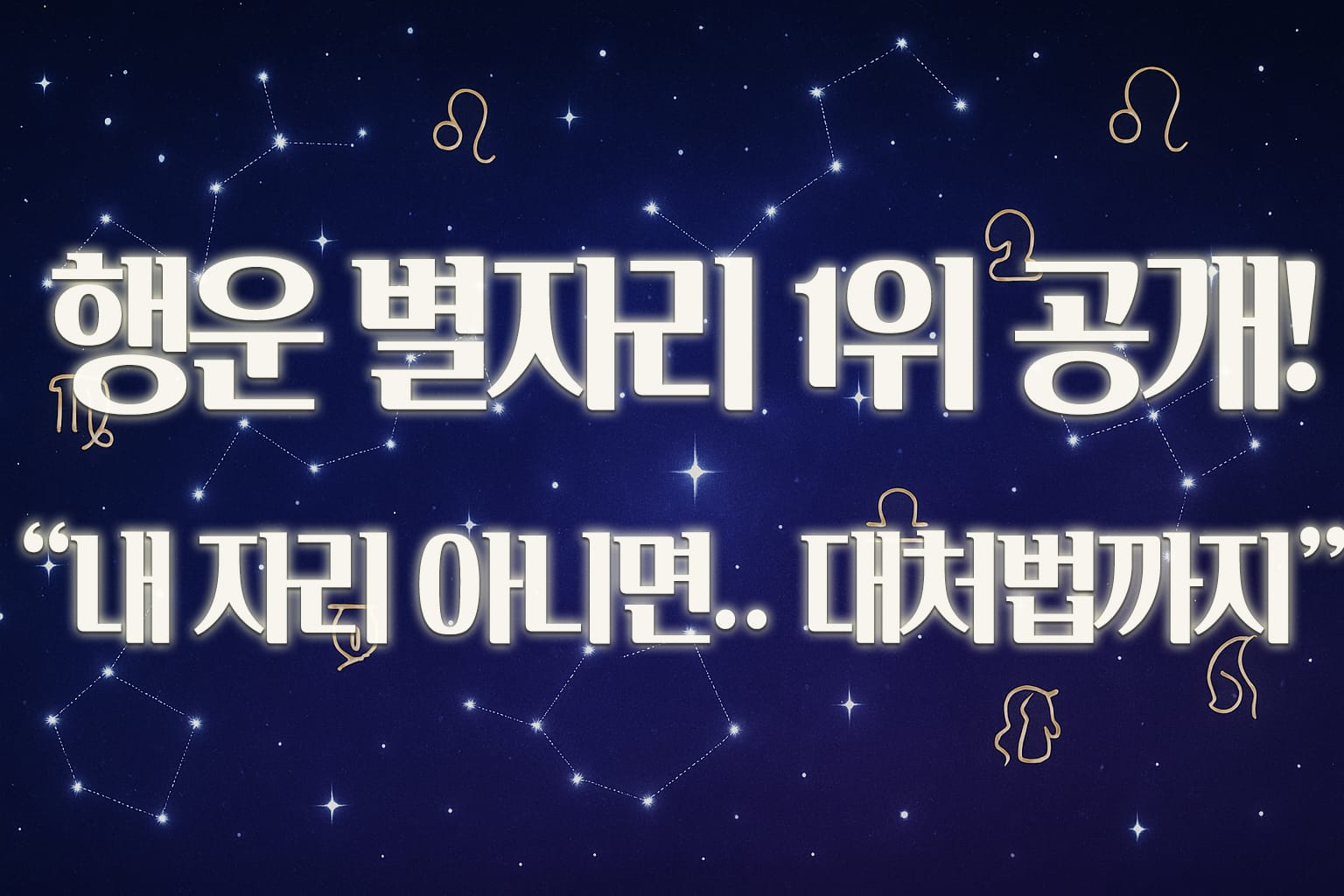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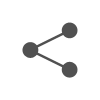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