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위와 집회가 뜨거워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풍경이 있다. 바로 경찰 버스들이 촘촘히 늘어서 만든 ‘버스 벽’이다. 이 거대한 차벽은 시위대를 막고 경찰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빈틈없이 세워지는지, 심지어 버스끼리 부딪히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숨어 있다. 이 기사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봤다.
버스 벽의 기원: 언제부터 시작됐나?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만드는 전술은 한국에서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정확한 시작 시점을 꼬집긴 어렵지만,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당시 전경(의무경찰)들이 시위대를 막기 위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버스를 동원해 물리적 장벽을 만든 게 시초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집회가 잦아지면서 버스 벽은 경찰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촛불집회 때는 수백 대의 버스가 동원돼 도심을 둘러싸며 그 위력이 극대화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태극기 집회에서도 여전히 활용됐으니, 이 전술은 정권을 가리지 않는 ‘시위 통제의 클래식’이라 할 만하다.
촘촘한 주차의 비밀: 어떻게 세우나?
버스 벽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간격이 촘촘하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춰진 모습인데, 이건 우연이 아니다. 경찰 버스 운전사들은 평소 훈련을 통해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익힌다. 보통 버스 한 대의 너비는 약 2.5m, 길이는 11~12m 정도인데, 이걸 옆으로 나란히 세울 때 간격은 고작 10~20cm 수준이다. 운전사들은 미리 정해진 위치에 따라 차례로 진입하며, 동료 경찰의 손짓 신호나 무전 지시에 의존해 정밀하게 주차한다. 때론 좁은 도로에서 방향을 틀며 세우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버스 측면 거울을 접거나 미세 조정을 반복하며 빈틈을 없앤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운전 경력이 많은 베테랑들이 주로 투입된다”며 “평소 주차 연습을 따로 할 정도로 공을 들인다”고 귀띔했다.
충돌은 없나? 버스 벽의 숨은 고충

이렇게 촘촘히 세우다 보면 버스끼리 부딪힐 법도 한데, 놀랍게도 충돌 사고는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속도가 문제다. 버스 벽을 세울 때는 시속 5km도 안 되는 거북이 속도로 움직인다. 살짝 스치더라도 큰 손상이 없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식이다. 물론 아주 없다고 할 순 없다. 2009년 민주노총 시위 때 버스 73대가 파손된 사례처럼, 시위대의 공격으로 망가진 적은 많았지만, 주차 과정에서의 충돌은 드물다. 한 번은 버스를 빼내려다 옆 차량과 살짝 긁힌 적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지만, 경찰은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한다”며 웃어넘겼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논란
버스 벽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때론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2020년 8월 태극기 집회에서 한 참전용사가 버스 사이 좁은 틈으로 지나가려다 운전사가 버스를 움직여 위험했던 사건은 SNS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반면, 시위대가 버스 위로 올라가 춤을 추거나 깃발을 꽂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버스 벽이 시위의 무대가 됐다”는 농담도 나온다. 하지만 시민들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경찰은 2009년 차벽 차량을 따로 도입하며 버스 의존도를 줄이려 했지만, 여전히 버스 벽은 현장에서 사랑받는(?) 전통 방식으로 남아 있다.
결론: 버스 벽의 미래는?
한국의 버스 벽은 시위와 경찰의 오랜 줄다리기 속에서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촘촘한 주차 기술과 충돌 없는 운영은 경찰의 노하우가 쌓인 결과다. 하지만 집회 보장 기조가 강화되며 차벽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도 보인다. 과연 이 거대한 벽이 언제까지 시위 현장의 풍경으로 남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궁금해진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버스 벽은 한국 시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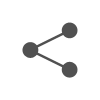
댓글0